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이를 해결할 방법도 모호함에 따라 과연 우리의 미래, 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막연히 그 장래가 밝고 문제없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만을 생각하는데 다소 주저하게 된다.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데 경제적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의 삶에 경쟁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로 여러 형태의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만약 경쟁이 없는 모두 동일하게 주어지는 환경에서 살아간다면 그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가 될 수 있냐는 엉뚱한 상상을 하지만 왠지 섬뜩함을 느끼게 되는데 자유를 상납한 기계적인 사회를 예측하게 된다. 그럼 과연 이상적인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사회는 있을 수 있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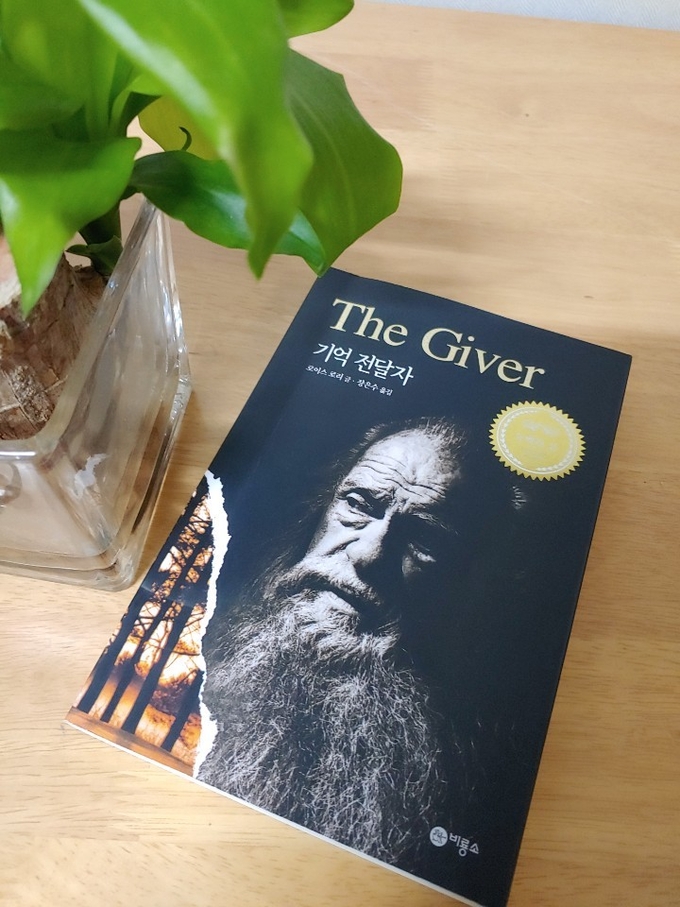
‘기억의 전달자’라는 제목은 과학소설을 연상하게 한다. 기억의 전달자 조너스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어떤 것인지 역설적으로 묻는 소설이라 생각한다. 모든 사회구성원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이상적인 사회를 이 소설은 제시한다. 모든 사회구성원의 감정을 없애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빼앗은 사회는 완벽한 사회가 된다. 인간의 본성과 본능을 무시하고 철저한 통제 속에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다. 인간성이 제거된 완벽한 사회, 그것이 곧 이상적인 사회 ‘유토피아’ 이다. 바로 조너스가 사는 세상. 그 세상은 몇 사람의 통제 장치로 안전하고 이익이 극대화된 곳이지만 단, 인간성이 한정된다. 이것이 그가 살 아사는 ‘유토피아’다. 인간에게 현실의 불합리와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사회로 인간의 존엄이란 찾을 수 없다. 단지, 완벽한 사회를 만들어낸 소수자들만이 이 사회를 그들의 입에 맞게 조리할 뿐이다. 이 완벽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느낄 필요도 없고 그들이 만들어낸 통합된 장치대로 행동하면 된다. 어떤 고통도 느낄 수 없기에 행복하다. 왠지 어색함을 느낀다.
그들의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는데 전체주의적 ‘디스토피아’가 오히려 더 잘 어울린다. 여기서 올더스 헉스리의 ‘멋진 신세계’와 조지 오웰의 ‘1984’도 생각나는데 그 이유로 ‘디스토피아’라는 공통된 분모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 나름 생각해 본다. 이렇게 유사한 소재를 여러 작품에서 다룬다는 것은 아마도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전 세계 곳곳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가장 타협적인 사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요소는 무엇인지 꽤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졌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지금까지 때로는 갈등하며 그 합의점을 찾아내며 거듭해 왔다. 다행히 ‘기억의 전달자’에서 주인공 조너스가 수세대의 기억 속에 남겨진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경험한다. 삶의 가치를 알고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그의 모습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지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완벽하게 편집된 세상을 벗어나는 보너스로 인하여 인간성이 말살된 완벽한 사회는 결국 가장 불완전한 사회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으로 가능한 다수의 구성원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거기에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완전한 무엇이 없을까 우리를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한다. 이는 모두가 잘살고자 하는 바람이 내재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여기서 서로 다른 우리들은 많은 갈등을 경험하지만, 이 또한 다수의 만족을 위한 무엇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기에 희망적이다. 그러나 ‘기억의 전달자’의 완벽한 사회는 이 합의점을 찾기보다 인간의 본성과 본능을 제거한다는데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다. 극단적이고 경직된 사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유연하게 타협하려는 시도조차 없는 회피적인 사회라 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나아갈 수 없는 죽은 사회가 되는 것으로 생각해 본다. 그들의 유토피아는 실제 디스토피아였던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사회는 존립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는 인간과 인간이 서로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집단으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해 나아가는 것이 완벽한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과정에서 정의의 필요성을 새삼 느끼게 된다. 정의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소통으로 그 해결점을 찾아낼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우리들이 실현할 수 있는 ‘완벽한 사회’라고 스스로 정리하게 되었다.
